|
부소산성을 걸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부여에 살면서 부소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오솔길에 접어들 때 어김없이 숙연한 마음을 갖는다. 백제 왕궁의 수비성이 간직한 숭엄한 기운과 백제의 후예의 혈맥을 타고 흐르는 유전자가 만나 하나 되는 의식이리라. 부소산 입구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21세기 최첨단 IT 시대에서 천 사백 년 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황홀한 여행이 시작된다.
부소산을 향하는 길을 따라 양쪽에 소나무가 도열해 있다. 그 길을 따라 처음에 만나는 삼충사에서 백제의 세 충신 성충, 흥수, 계백을 만나고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한다. 승리에 도취한 왕에게 적극적으로 간언하여 옥에 갇히고 죽는 순간까지 백제의 앞날을 걱정했던 충신과 나당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처자를 칼로 베고 황산벌로 달려간 백제의 마지막 장군을 생각하면 목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삼충사에서 다시 오솔길로 접어들면 양쪽의 나뭇가지들이 합수하듯 차일을 만들어 준 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계백장군이 황산벌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달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계백장군이 핏방울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그 길을 걸으면서 발걸음마다 그날의 비애를 떠올리면서 걷는다.
삼충사에서 부소산 정상으로 가는 초입은 계절마다 나무들이 연출하는 경관이 감탄을 자아낸다. 봄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길을 밝혀준다. 벚꽃이 낙화할 때 이루는 슬픔의 절정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다. 여름에는 태양의 몸부림과 매미의 절규가 경쟁한다. 누가 떠 뜨거운지 누가 더 날카로운지 한 치 양보가 없다. 나무마다 청록색 잎을 활짝 펼쳐 나그네를 보호해 준다. 가을에는 그 나무들이 본색을 드러낸다. 나무마다 DNA를 감추지 못하고 빨간 나뭇잎은 새빨갛게 노란 나뭇잎은 더 노랗게 전율한다. 그 길에 접어들면서 외마디 탄성이 없다면 목석이리라. 아! 겨울에는 온통 순백의 목화솜을 뒤집어쓰고 고요하게 숨죽인다. 부소산성은 사계절 내내 신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호흡이 가빠질 즈음에 우뚝 서 있는 정각 영일루를 만난다. 영일루는 부소산의 맨 동쪽 산봉우리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왕과 가족들이 새해에는 계룡산의 연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나무계단을 올라 영일루에 올라 멀리 동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휴식하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땀을 닦아주고 등을 떠밀어 발길을 재촉한다.
부소산성은 백마강이 반달처럼 휘돌아 흐르고 북쪽은 경사가 급하여 왕궁의 수비산성으로 완벽하다. 백제시대 왕궁으로 관북리 유적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역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군창지 유적지는 군대 곡식을 보관했던 창고로 불에 탄 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왕궁과 도성을 수호한 중심산성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평상시 왕가의 비원으로 아름다운 풍경과 감동을 주었으리라. 그 길을 걸으면서 백제시대의 한복판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이다.
반월루 광장에 이르러 동북쪽으로 내려가면 태자골이 나온다. 백제시대 태자들의 산책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자골에 아담한 정자 궁녀사가 있다. 태자골을 걸을 때마다 궁녀사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다. 궁녀사는 백제가 멸망할 당시 적에게 유린당하느니 백제 여인의 정조를 지키고자 백마강에 스스로 몸을 던진 궁녀들의 넋을 기리고자 세운 것이다. 태자들은 궁녀들의 가슴에 간직한 별이 아니었을까. 궁녀들의 넋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이가 태자가 아니겠는가 안심의 미소를 짓는다.
궁녀사에서 다시 반월루 광장으로 돌아와 반월루에 정각에 올라가면 부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부여 시내를 휘돌아 백마강은 유유히 흘러만 간다. 백제 전성기에는 당나라와 왜 나라 상인들을 싣고 구드래 선착장에 당도해서 활발한 교역을 이루었다. 사비성이 함락되던 날에는 당군을 데려와서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사비성을 뒤덮었다. 부소산성에서 남쪽으로 시내 한복판에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몸에 당나라 장군이 백제를 평정했다는 오욕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천 사백 년 동안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반월루에서 내려와서 낙화암으로 향하여 걷는 걸음은 천근만근이다.
낙화암은 백마강을 향하여 깎아지른 절벽이다. 바위가 우뚝 솟은 곳에 육각 지붕의 정자 백화정이 있다. 백화정 앞에서 백마강을 내려다보면 푸른 물살이 출렁거린다. 백제의 연약한 여인들은 왕궁에서 낙화암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녀들은 나당연합군의 치욕에 짓밟히지 않고 죽음으로써 백제 여인의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선홍빛 꽃이었다. 백제의 하늘에서 일제히 물속으로 자진한 슬픈 별똥별이었다. 낙화암 절벽 아래 햇살을 희살 짓는 강물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힌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떨리는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다.
낙화암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를 생각해 본다. 최초의 국가가 멸망하고 다시 국가를 건국하고 도돌이표를 연주하듯 이어온 반만년 역사 속에서 유독 백제의 멸망에 대해 휘두른 승자의 무자비한 채찍에 몸서리친다. 의자왕은 태자시절에 효심이 깊어서 ‘해동증자’라고 불렸다. 적극적인 정복전쟁으로 백제의 마지막 중흥을 이끌었던 의자왕. 승자들이 오명을 덧씌우고 제멋대로 곡해한 비운의 군주. 당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
부소산성을 걷는 것은 어쩌면 천 사백 년 전 백제시대로 가는 타임머신에 탑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섶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조차 그 생명을 백제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왔을지도 모른다.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도망가는 다람쥐의 조상도 백제시대부터 이어왔는지도 모른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고 별나라에 가는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역주행하면서 독백한다. 온고지신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칼럼·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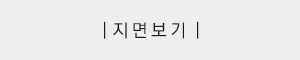




 많이 본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