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1970년에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예비군 훈련시 정관 수술하는 모습도 실제로 있었을 만큼 인구의 폭증 문제가 심각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2002년에는 그 숫자가 꼭 절반인 50만 명으로 줄었고, 20년이 더 지난 2022년에는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 신생아는 25만 명이 되었다.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는 0.7명 정도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적은 숫자이다.
반면에 반세기 전의 우리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에 그쳤으나 현재는 84세에 이르러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신생아 감소와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이러한 인구 절벽은 심각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한편 우리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40여 %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많은 대학들이 그동안 학생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처럼 학생들이 서울로 쏠리면서 지역 대학은 모두 고사할 위기에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소위 이모작 인생 가꾸기이다. 대학에서 노년층을 재교육시켜 생산과 소비의 핵심 연령층으로 재교육하는 것이다.
그간 대학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대학이 평생 교육에 한 걸음 나아가 교육 대상 및 목표를 새롭게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젊은이들만으로는 존립하기 어렵게 된 우리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니겠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대학의 책무이기도 하다.
2021년 기준, 전국 221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 지역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성장이 인재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유출과 무활력이다. 지역 소멸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활기를 잃은 농촌은 효율적 국토 활용과 경제 활력을 낮추고 지역 갈등을 야기시킨다.
본래 대학과 도시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의 관계다. 대학은 지역을 이끌 지도자와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양성하는 허브이다. 지역 지식인, 예술가, 과학자들이 활동하는 무대이고, 지역 혁신가를 배출하는 인큐베이터이다. 무엇보다 대학은 청년의 꿈을 키우는 터전이고 지역이탈을 막는 ‘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청년뿐 아니라 중 장년의 평생 교육을 위한 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칼럼·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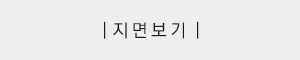



 많이 본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