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세상을 버리신 지도 강산이 한 번 변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공주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아버지를 만나도, 아버지가 아닌 동생에게 용돈을 건넨 지도 꽤 되었다. 연세 탓이라 단정하긴 아쉽지만, 아버지는 근래에 간간히 치매라는 손님의 의지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때로는 소변을 제대로 가리신 일로 칭찬을 받고, 자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신다. 자식의 나이 또한, 세월이 야속하다는 것을 알 때가 되었건만 여전히 울적한 어버이날이다. 내 의지대로 말하고 싶지만, 행동의 반은 손님에게 맡겨 두신 아버지. 요즈음은 부쩍 옛 추억을 들추는 것으로 소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정신이 맑으실 때는 온통 손주들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렇지 않으실 때는 오래전 당신이 어렸을 적 이야기만 하신다. 묵은 된장과도 같이 숙성된 아버지의 추억담은 언제나 구수하다. 정신이 맑으실 때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씀을 가려 하시다가, 그렇지 못하실 때 당신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한스러운 세월을 살아오셨음에도, 원망의 말씀 한마디 없으신 것 또한 애잔하다. 어린 시절을 일제의 치하에서 서럽게 보내시고, 나이가 들면서 전쟁과 가난에 맞서며 가정을 지켜야 했던 아버지. 가장으로, 가족의 주린 배를 책임져야 했던 때에는 추억의 시간마저 낭비였으리라. 얼마 전, 나이가 드니 돈으로는 가난해도 시간이 부자라며 호기를 부리시던 아버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에서 물러서서, 당신의 추억을 가지고 노실 시간에 흡족하셨던 모양이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이 얇아지는 것. 그 소중한 시간에, 당신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 미루어 두었던 행복인지도 모른다. 당신의 추억이 시리게 아름답지 못해도, 격동의 세월 속에서 별의 별 사연을 다 쓸어안아 담아두셨을 것이다. 이제는 한가로이 추억을 실타래를 풀고자 하나, 치매라는 손님이 끼어들어 엉뚱한 이야기가 되니 들어줄 이 또한 없다. 단연코 자녀에게 받으려 하는 부모는 없고, 남은 육신까지도 자식에게 쓰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자식 또한 어떤 이의 부모가 되어 일상에 쫒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환갑을 맞은 자식이 어버이날을 맞아 철없이 울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칼럼·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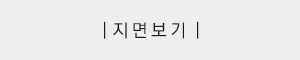



 많이 본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