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 년 전 수지침을 배운 적이 있다. 과학적 검증을 떠나서,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플 때 그 작은 침으로 손가락을 찔러 해결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기맥이 무엇이고 혈도가 어떻다는 말은 다 잊었지만, 서양의학은 아픈 곳을 직접 치료 하고, 동양의학은 아프게 된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기억에 남았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커다란 하나(우리)로 보고 치료한다는, 명쾌하진 않지만 이해가 갈법한 이야기였다. 같은 이치라 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사도 여기에 빗대어 설명하셨다. 서양 사람들의 의식으로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의 결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장가는 내가 가더라도 아내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오는 것이다. 우리 마누라가 되어서... 귀에 착 달라붙는 설명이다. 혼수품에 삼촌, 작은 어머니가 빠지지 않고, 폐백 때 시아주버니, 동서 또한 분주하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내 아들’보다는 ‘우리 아들’이 익숙하고, 외동딸이 쓰는 말도 ‘내 엄마’보다는 ‘우리 엄마’가 친숙하다.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집단에 속해있기를 좋아했으며, 한 배를 탄 구성원은 가족을 넘어 가문이 되기도 하였다. 흔히 쓰던 ‘뉘 집 자식’이라는 말은 이런 공동체적 ‘우리’ 의식을 명확히 설명하는 말이다. 이러한 전통의식이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심지어 우리가 남이냐? 면서 운명을 한데 묶어 생활해 왔다. 이렇게 우리는, 아내와 아들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을 담보하며 ‘우리’라는 이름을 붙여 써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런 ‘우리’의식이 변색되어 가는듯하여 못내 아쉽다.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패륜이 그렇고, 입에 담기 어려운 아동학대의 심각성도 도를 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라는 이름의 공동체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개인주의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은, 이웃의 목숨이 나의 하루 향락만도 못하다. 자신의 비열함까지 남 탓으로 돌리고, 남들의 순수까지 색안경 너머로 본다. ‘우리’가 실종된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식이 퇴색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변해가고 있다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하고, 그 시작은 나의 아내를 진정한 ‘우리 마누라’로 사랑하는 것부터다. 백번을 잘해도 당연하고, 한 번의 잘못은 서운한 게 부부의 이치다. 서로는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지만,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것 또한 우리네다. 내 곁을 떠나본 적 없는 공기와 물을 생각하니, 진정 소중한 것에게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 같다. 평생 동안 5만 번 넘게 밥해 준다는 고마운 나의 ‘우리 마누라!’ 잘 모셔야겠다. 당장 오늘 저녁 ‘사랑한다.’ 말하기다. 정 쑥스럽다면 ‘고맙다.’면 어떤가?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칼럼·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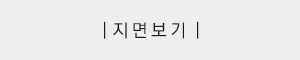



 많이 본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