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람이라면 이정도 상황에서는 이정도의 감정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래야 “정상이다”라는 어떠한 일반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선을 그만 벗어나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엄마는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가운데에서 조차 살인용의자로 몰렸던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누구나 감정이 부자연스럽다 보면 예기치 못한 힘든 일도 당해 본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경찰관 동료들에게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슬퍼도 웃어야 하고 억울해도 웃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우리 경찰관들은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점원이나 각종 판매원, 상담원들과 같이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종사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최일선 대민 접점부서에서 각양각색의 민원인을 계속 응대해야 하는 지방청·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속마음을 감춘 채로 근무시간 내내 주취자 등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웃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서는 분명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님에도 갖은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할 때도 비일비재하다. 경우야 어떻든 욕하면 욕하는 그대로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이라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정과 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직업인이기 앞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행복을 추구할 작은 권리는 있지 않을까 싶다. 만약 우리 경찰관 동료들의 부자연스러운 감정상태가 지속 된다면, 감정이 매 말라 피폐해져 버린다면, 한국판 “표정없는 경찰관” 이 생겨날까 두려운 맘이 앞선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폭넓게 생각하면 근무 중인 경찰관은 어쩌면 나의 아버지요, 삼촌이요, 자식이고, 형제라는 사실이다. 언제나 우리의 가족을 위해 날 밤 새기를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 아저씨들이 말이다. 우리 경찰관들의 “급선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근무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경찰관도 감정이 있는 똑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인정해 주고 대접을 해준다면 우리 경찰관 동료들은 그 급선무를 기필코 이행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칼럼·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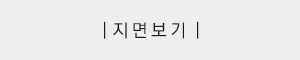



 많이 본
많이 본 








